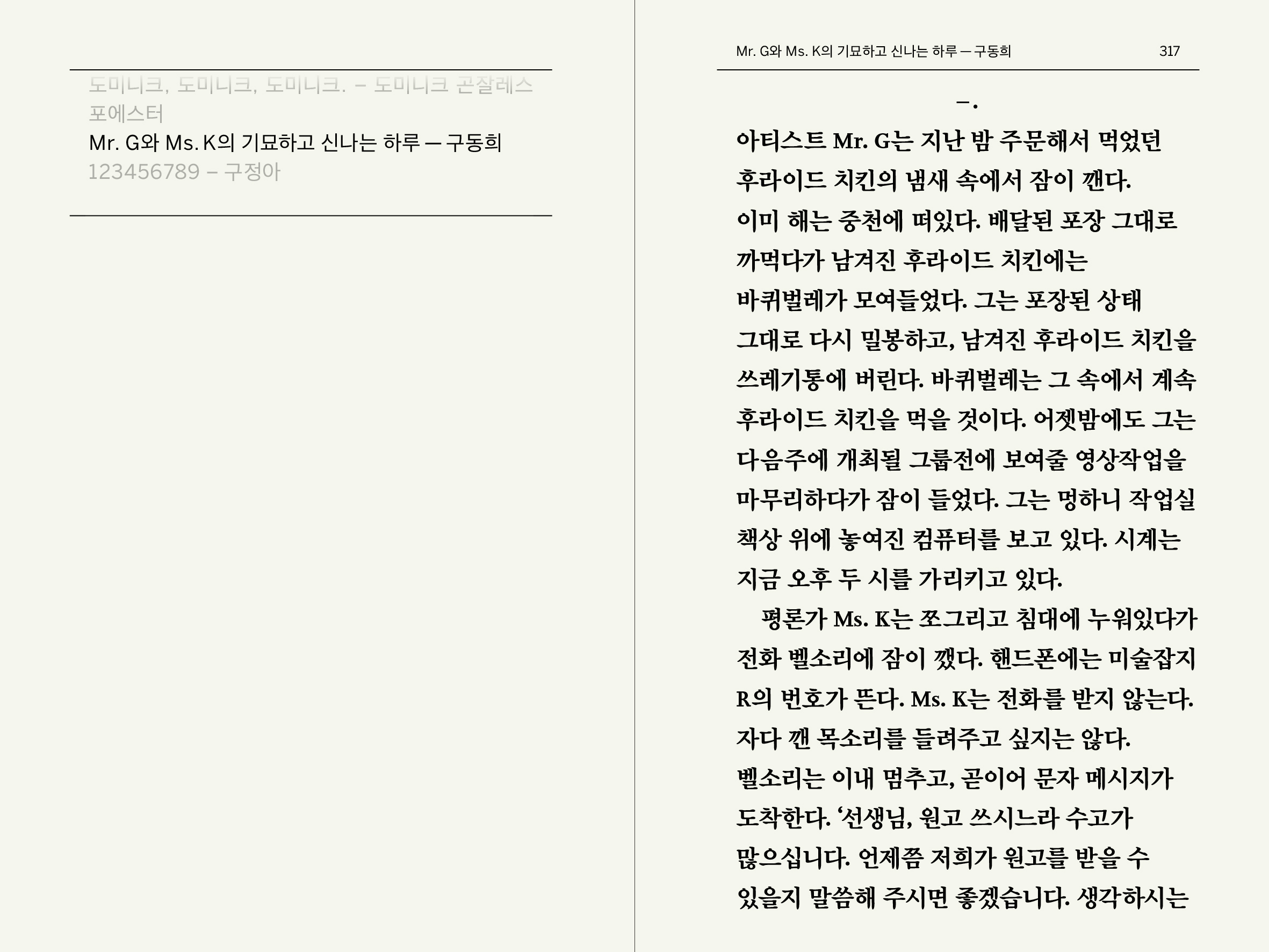불가능한 대화 - 미술과 글쓰기
![]()
김장언 지음
미디어버스 발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
ISBN 978-89-94027-94-4 90600
105x150mm / 432페이지
값 15,000원
책 소개
2000년대 초반부터 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 활동해온 김장언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술 매체와 학술지, 카탈로그 등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는 이 책에 수록된 글을 통해 3가지 새로운 글쓰기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각주와 미주 없는 글쓰기, 미술 글쓰기 방법론으로써 픽션과 논픽션을 재발명하기, 글쓰기에서 대화를 다시 창안하기라는 원칙이 그것이다. 3가지 원칙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동시대 미술과 예술을 서술하는데 왜 그러한 원칙을 만들었고 그것이 유의미한지 증명하고 있다.
1부인 ‘전환과 공회전’에서 그는 『아티클』에 기고했던 글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미술이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커뮤니티 아트, 생태미술, 협업, 공동체, 예술과 노동, 미술 기관 등과 같이 미술과 예술 안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13편의 글에서 다뤄진다. 2부인 ‘무한한 대화’는 저자가 미술 글쓰기 방법론으로 픽션과 논픽션을 재발명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드러나 있는 장이다. 총 6편의 글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구동희, 이수성, 도미니크 골잘레스 포에스터, 구정아와 같은 현대미술 작가들을 다룬다. 이 장에서 저자는 비평가와 작가 사이의 위치와 거리를 조정하면서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서 새로운 미술 글쓰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3부인 ‘불/가능한 글쓰기’는 여전히 미술을 글쓰기의 대상으로 두지만 산문적 글쓰기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27개의 글에는 20여년간 미술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해석해온 저자의 경험과 지식이 응축되어 있다.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비평 언어와 그것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실험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포기할 수 없는지 증명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목차
I. 전환과 공회전
착한 예술 10
협업과 횡단 20
보이지 않는 그림들 32
침묵과 재현 42
녹색에 대한 질문들 54
너무나 팝적인 당신에게 70
신뢰 82
전환과 공회전 94
예술가의 위치: 공동체와 작가 110
지역, 공동체, 세계 140
이미지와 공동체 — 무한한 타자 182
… 혹은 더 나쁘거나 202
어떻게 ‘우리의’ 미술관을 만들 것인가? 228
II. 무한한 대화
불편한 대화 246
작업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 이수성 282
7개의 키워드와 두 사람의 생각들 — 방혜진 294
도미니크, 도미니크, 도미니크 —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 310
Mr. G와 Ms. K의 기묘하고 신나는 하루 — 구동희 318
123456789 — 구정아 352
III. 불/가능한 글쓰기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 당신에게 36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위한 소망의 문장들 373
어처구니 없지만 377
48분 후 — 니코에게 387
M과 결혼한 여자 391
바캉스 409
학의 다리 413
2035 423
저자 소개
김장언은 미술이론과 문화이론을 전공했고, 월간 『아트』지 기자(2000), 대안공간 풀 큐레이터(2001~02), 안양공공예술재단 예술팀장(2006~07), 제7회 광주비엔날레 〈제안전〉 큐레이터(2008), 계원예술대학 겸임교수(2011~1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기획2팀장(2014~16),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디렉토리얼 컬렉티브를 역임했다. 큐레토리얼 프로젝트로 〈장르 알레고리 — 조각적〉(토탈미술관, 2018), 〈시징의 세계〉(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5), 〈소행성 G〉(협업 김소라, 최춘웅, 이주나, 공주시 금성배수장, 2013), 〈픽션워크 —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2), 〈박이소 — 개념의 여정〉(공동기획,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1), 〈Mr. Kim과 Mr. Lee의 모험〉(연출 정서영, LIG 아트홀, 서울, 2010), 〈나눔 — 불법적인 것을 위한 실험〉(플랫폼 2009, 기무사터, 서울, 2009) 등이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김현진, 양혜규, 이주요와 함께 우적(friendly enemies) 동인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임민욱, 프레데릭 미숑과 피진 컬렉티브(pidgin collective)로 활동했고, 2009년에 설립한 독립적 동시대 미술 실험실인 ‘노말타입(normal type)’을 2013년까지 운영했다. 저서로 비평집 『미술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현실문화연구, 2012)가 있다.
책 속에서
“‘불편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강연은 독백처럼 마무리되었다. 나는 전시를 ‘시각적 구조물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여긴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화의 방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전시라는 이름의 대화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친밀함을 야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과 불일치 그리고 불화를 야기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었고, 큐레이터로서 나는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대화의 불가능성 아래서 대화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지평을 상상케 하는 가능성으로 나에게 다가왔던 것 같다. 강연이 끝나자 한 청중은 나에게 독백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독백에 대한 그의 질문이 곧 침묵에 대한 질문처럼 여겨졌다.” (46쪽)
“동시대적 삶은 이제 녹색에 대한 질문들과 필연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로하스와 웰빙의 문제와 같은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삶의 기저를 형성하고 창조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삶의 재앙은 지난 날처럼 계급적, 이데올로기적 문제 속에서 출연한다기 보다 생태학적 파국 속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그러나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가타리의 논의처럼 비단 산업 공해와 같은 환경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관계와 인간 주체성의 영역에 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가타리의 주장처럼 녹색의 위기, 생태학적 위기는 모든 재화와 가치의 생산 방식과 그 목표에 대한 창조적 재설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는 실천을 재조성하는 선들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56쪽)
“신자유주의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내던져 버리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신뢰를 스스로 지워버린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그 빈 영역에서 상품화된 믿음을 판매한다. 신뢰와 믿음은 스스로 형성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 (85쪽)
“한국 미술계에서 신자유주의 이후 작동된 공공미술은 시장과 정부 둘 모두에서 발명된 유사 정치적인 것의 증거물이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의해서 호명되는 공공미술은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 사이에서 자본화된 심미적 삶의 형태를 돌출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상품의 프로모션 전술의 하나로 활용된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의 통합과 사회적인 것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미술을 또 다른 온순한 형태의 공공성으로 활용한다. 사회적인 것을 시장에 위임한 정부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미술을 호명한다. 미술은 탈사회화된 통치술 내부에서 위장된 공공성의 증거물이 된다. 그리고 작가들은 비즈니스의 하나로 그 사이에서 진동한다.” (100쪽)
“내가 대안공간의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 지도교수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왜 자신의 일과 공부 그리고 삶을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는 늘 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것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다. 결합은 단순히 어긋난 그 지점을 다시 붙이는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분리된 지점의 상처와 흔적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것이다. 결합은 어쩌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 그 결합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286쪽)
“구정아는 7백여 장의 사진을 2004년 〈Club Koo〉와 〈Wednesday〉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기록된 이 사진들은 그의 작가적 삶과 개인적 삶의 어떤 흔적을 드러낸다.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와 우리가 살아가는 유사하지만 다른 삶의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2009년 그는 〈New Song, O〉라는 제목으로 1백여 장이 넘는 그림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가 그림을 만나도록 했다. 일상의 파편은 유령처럼 그곳에 출현하고, 구멍 없는 피리에서는 노래가 흘러 나왔다.” (352쪽)